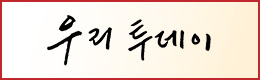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세종 5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8월 2일(갑술) 4번째기사|닥나무.세초.한지지폐
임금이 말하기를,
“금·은의 금지령이 이미 시행되어서 민간에서는 쓰지 못할 것이요, 민간에 미곡이 매우 귀하다 하니, 미곡으로 금·은을 사들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
한즉, 공조 참판 강회중(姜淮仲)이 아뢰기를,
“쌀값이 매우 비싸서, 백성들이 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하였다. 임금이,
“그러면 값을 싸게 하여 팔라. ”
하니, 예조 판서 허조(許稠)가 대답하기를,
“요사이 민간에서 떠들썩하게 전하기를, 국가에서 장차 저화(楮貨)195) 를 쓰지 않을 것이라 하여, 저화 한 장 값이 쌀 서 되에 지나지 아니하니, 이것도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인즉, 금·은의 예에 의거하여 쌀로 사들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장 A면
【영인본】 2책 329면
【분류】 *물가-물가(物價) / *금융-화폐(貨幣)
[註 195]저화(楮貨) : 지폐. ☞
세종 52권,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6월 2일(갑오) 7번째기사|닥나무.세초.한지지폐
하교하기를,
“형벌은 정치를 돕는 일이라, 예전에 교화가 성하던 시대에도 진실로 없앨 수 없었던 것이다. 순(舜)이 천자가 되어 오직 형벌을 삼가고, 고요(皐陶)가 사사(士師)가 되어 오형(五刑)을 밝혀서 오교(五敎)를 도와 능히 화합하고 밝은 정치를 이루었으니, 아아, 성하도다. 진 시황(秦始皇)에 이르러 잔포(殘暴)를 숭상하여, 조고(趙高)의 무리들이 가혹하고 급박한 법을 힘쓰고, 어진 은혜가 없어 이세(二世)만에 망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으랴. 옥사(獄事)란 것은 사람의 사생(死生)이 매인 것이니 진실로 참된 정상을 얻지 못하고 매질로 자복을 받아서, 죄가 있는 자를 다행히 면하게 하고, 죄가 없는 자를 허물에 빠지게 하면, 형벌이 적당하지 못하여 원망을 머금고 억울함을 가지게 하여, 마침내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되면 족히 천지의 화기를 상하게 하고,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부르게 되니, 이는 고금(古今)의 통환(通患)이었다.
나는 이것을 퍽 염려하여 과거에 있은 형옥(刑獄)의 변을 살펴보고 우선 더욱 두드러졌던 일들을 들겠노라. 진(晉)나라 때 임치현(臨淄縣)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시어머니를 매우 공경히 섬겼다.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나이가 젊음으로 개가(改嫁)하기를 권하였으나, 며느리가 절개를 지키고 듣지 않으므로, 시어머니가 민망히 여겨 몰래 자살하였는데, 친척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고발하여 관에서 국문하니, 과부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거짓 자복하여 옥사가 결정됨에 이르렀는데, 마침 조터(曹攄)##가 현령이 되자 그 억울함을 알고, 다시 분변하고 연구를 더하여 갖추 그 실정을 알았으므로, 그 때에 그의 밝음을 일컬었다.
당(唐)나라 때에 회서(淮西)의 오원제(吳元濟)가 반역하자, 황제는 모든 군사 일을 승상(丞相) 무원형(武元衡)에게 위임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성덕왕(成德王)승종(承宗)이 사람을 보내어 중서부(中書府)에 나아가 원제를 위해 유세(遊說)하였는데, 말이 불손(不遜)하므로 원형이 꾸짖어 내치니, 승종도 글을 올려 원형을 꾸짖었다. 원형이 죽임을 당하자, 왕사칙(王士則)이 승종이 보낸 군사 장연(張宴)의 짓이라고 하여 잡아 국문하자, 연 등이 함께 자복하여 곧 베었다. 그 뒤에 노(虜)를 평정하고 이사도(李師道)가 왕명을 거역하여 사형을 당하였는데, 그 문적을 펴 보니, 원형을 죽인 자에게 상 준 것이 있으므로, 그제야 원형을 죽인 것은 승종이 아니라 사도라는 것을 알았다.
송나라 때에 전약수(錢若水)가 동주 추관(同州推官)이 되었는데, 어떤 부잣집의 어린 계집종이 도망하였는데, 간 곳을 몰라 그 종의 부모가 고을에 소송하므로, 녹사(錄事)에게 국문하도록 하였다. 녹사가 일찍이 그 부자에게 돈을 꾸려다가 꾸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추핵하기를, ‘부잣집의 부자(父子) 등 몇 사람이 계집 종을 함께 죽이고, 시체는 물 속에 버려서 시체를 잃었다. ’고 하였다.
부자가 매질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거짓 자복하였고, 주관(州官)의 복심(覆審)에도 다름이 없었으나, 약수가 홀로 의심쩍게 여겨 그 옥사를 머물러 두고 수일 동안 결단하지 않으니, 녹사가 약수를 욕하기를, ‘네가 부자의 돈을 받고 죽을 죄인을 내어 보내려고 하느냐. ’ 하자, 약수는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지금 수명(數名)이 죽음을 당하는데 어찌 조금 머물러 두고 옥사(獄詞)1667) 를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 하고 열흘 동안이나 머물러 두었다, 지주(知州)가 여러 번 재촉하여도 어찌할 수 없었다.
상하가 모두 괴이하게 여겼는데, 약수가 하루 아침에 지주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제가 그 옥사를 머물러 둔 것은 몰래 사람을 시켜 여종을 찾으려던 것인데, 이제야 찾았습니다. ’하고는 몰래 여종을 지주소(知州所)에 보냈다.
지주가 이에 발[簾]을 드리우고 여종의 부모를 불러다가 묻기를, ‘네가 지금 네 딸을 보면 알겠느냐. ’ 하니, ‘어찌 알지 못하오리까. ’하므로, 발을 걷고 밀어내어 보이니, 부모가 울면서, ‘바로 이 아이입니다. ’ 하였다. 이에 부잣집의 부자를 모두 석방하니, 그 사람이 울면서 말하기를, ‘사군(使君)아니었더라면 저희들은 멸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 하니, 지주가, ‘추관(推官)의 은혜다. ’하였다. 송태종(太宗)이 듣고서는 갑자기 〈약수를〉 포창하여 뽑아 썼던 것이다.
또 호북시(湖北市)의 어느 집에 부부 두 사람만이 살았는데, 부인이 아름다워 남편을 부족하게 여기더니, 우연히 점 치는 사람이 와서 기숙(寄宿)하였다. 부인이 그의 준아(俊雅)함을 사모하여 드디어 그 남편을 죽이고 정을 통하여 함께 가기를 원하니, 점 치는 사람이 그녀의 불의를 분히 여겨, 그 남편을 보는 척하다가 칼로 부인까지 함께 죽이고 떠나가 버렸다.
아침이 되자 그 집에서 상주(常住)하면서 공역(工役)하던 늙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보니 두 시체가 함께 포개어져 있고 피가 흘러 땅에 흥건하였다.
자기에게 연루될까 두려워하여 곧 도망하였더니, 잠시 후에 이웃에게 발각되어, 공역하던 자를 잡아 관에 아뢰니, 다시 변명하지 아니하고 곧 거짓 자복하였는데, 점치는 자는 간 뒤로 날마다 저자에서 점치기를 예사로 하였는데, 〈하루는〉 공역하는 자가 사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듣자 곧 자수를 하였던 것이다.
헌사(憲司)에서는 점치는 자가 여자를 죽인 것은 남편의 목숨을 보상한 것이며, 또 자수한 것을 의(義)롭게 여겨 공역하는 자와 함께 석방하였던 것이다.
또 임강(臨江)에 왕삼랑(王三郞)이란 사람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다락에서 살았는데, 그의 아내가 난간에 기대어 서서 과실을 먹다가 씨가 공교롭게도 배에 있던 소년의 수건에 떨어졌다. 소년이 쳐다보고 부인이 유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날이 저물자 그 집에 들어갔더니, 고요하여 사람의 소리가 없으므로 곧 다시 배에 올랐는데, 그 신이 젖은 것을 깨닫고 부뚜막에다 놓고 불에 쬐어 말렸다.
그날 밤에 왕삼랑이 돌아와 보니 아내는 죽어 있고, 피가 흘러 땅에 흥건하였다. 아침에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핏자국이 배 안에까지 이른 것을 보고, 드디어 소년을 잡아 고을에 넘겼다. 소년은 다시 변명하지도 못하고 거짓 자복하게 되었으나, 다만 부인의 신과 죽인 칼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옥리가 가까운 강가 정자의 현판을 가리키며, 물건이 있는 듯하다고 하므로, 가서 보니 과연 신과 칼이 있었다.
이리하여 범죄 사실이 성립되었는데, 옥급(獄級) 진청(陳靑)만은 이를 의심쩍게 여겨 여가를 청하고는 일찍 강 위에 가니, 왕(王)의 이웃 부인이 그 일을 물으므로, 진이 대답하기를, ‘벌써 배 안의 소년은 정형(正刑)했다. ’고 하자, 이웃 부인이 깜짝놀라며, ‘원통하다. 정범자는 아무 옥리이다. ’ 하였다.
진은 비밀히 사리(司理)에게 고하고, 옥리를 불러 추문하여, 진상을 낱낱이 다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년을 드디어 석방하고 옥리는 사형에 처하였다.
원나라 때에 원주(袁州)평향(萍鄕)에 높은 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재 북쪽에 사는 장(張)가란 남자와 재 남쪽에 사는 주(周)가란 여자가 결혼하였는데, 한번은 여자가 친가에 갔었기 때문에 장(張)이 그 아우를 보내어 마중해 왔다. 재의 중간쯤 지점에 이르자 아내는 피곤하여 잠깐 앉아 쉬었는데, 아우가 먼저 어린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 되어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장과 그 동생은 같이 앉아 쉬었던 곳에 가 보아도 없었으므로, 다시 주(周)의 집에까지 가 보았으나 역시 없었다. 주와 함께 다시 재에 올라 찾아본즉, 아내가 숲 속에서 죽어 있었는데 또 머리가 없었다.
주가 동생을 결박하여 관가에 가서, ‘동생이 외람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순응하지 않으므로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고 하여, 동생은 드디어 거짓 자복을 하였다. 관가에서는 강제로 도감(都監)에게 머리와 칼을 찾게 하니, 도감이 머리와 칼을 구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동생은 처형되었는데, 해가 지나서, 장의 두 이웃 사람이 그의 아내를 건강(建康) 여관(旅館)에서 만나 서로 보고 놀랐다. 이웃 사람이 내력을 말하니, 아내가 울면서 말하기를, ‘억울하다. 그때 내가 재 위에서 앉아 쉴 때에 어떤 털보 길손 한 사람이 대나무 농[箬籠]을 메고 산에 올라오더니,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칼을 뽑아 나를 협박하여 의복과 신을 빼앗아서 대나무 농 속에서 한 부인을 불러내어 입히고는, 그 머리를 베어 농 속에 넣고 시체는 숲 속에 버린 다음, 나를 대나무 농 속에 들어가게 하여 짊어지고 다닌 지 반 달이 넘어서 여기에 도착했다. ’고 하였다.
얼마 안 되어 털보가 돌아왔다. 두 이웃 사람은 그를 결박하여 관가에 고하니, 곧 그대로 자복하고 변명하는 말이 없었다. 형부(刑部)에서 교지를 받아 그 털보를 사형에 처하여 그 동생의 목숨을 보상하고, 주현(州縣)의 아전들은 각각 경적(黥籍)시키며, 읍재(邑宰)·군 사리(郡司理)·검복관(檢覆官) 등은 모두 낮추고 파면시켰다. 먼저 도관(都官)이 관사(官司)의 명령에 못이겨서 다른 사람의 관(棺)을 몰래 열고 부인의 머리를 취하여 해결하였으므로 역시 사형에 처하였다.
또 경사(京師)에서 소목국(小木局)의 목공(木工)이 그 장(長)과 다투었는데, 장이 잘못하였으나 굽히지 않으므로, 목공이 드디어 절교(絶交)하고 왕래하지 않았다. 여러 목공들은, ‘입다툼 정도야 그게 무슨 큰 혐의가 되겠는가. ’ 하면서,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억지로 목공을 장한테로 데리고 가서 화해시키고, 저물어서 모두들 취하여 흩어져 갔던 것이다. 목공의 아내는 음란하였는데, 간부와 공모하여 남편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적당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 날에 원수인 사람에게 술에 취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죽이고는, 황급한 나머지 시체를 숨길 곳이 없어서 방안에 토탑전(土榻甎)을 열고 빈 속에 넣고다시 전(甎)을 예전대로 놓았다. 이튿날 아내가 장의 집에 가서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어제 돌아오지 않았으니 반드시 죽인 것이라. ’고 하며 경순원(警巡院)에 소송하였는데, 원에서 장이 과거에 원수였기 때문에 체포하여 고문(拷問)하니,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거짓 자복하였다.
원에서 장에게 시체가 있는 곳을 물으니 〈하는 수 없이〉 호(壕) 속에 버렸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오작(仵作) 두 사람을 독촉하여 호를 탐색했으나 얻지 못하였다. 형부 어사(刑部御史)와 경윤(京尹)이 번갈아 독촉하여 옥사(獄事)를 갖추기에 심히 급하여, 기한을 10일, 7일, 5일, 3일로 정하여 네 번이나 매를 맞았으나 마침내 찾지 못하였는데, 기한이 더욱 가까와 오자,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명령에 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날이 어두워서 물가에 앉았다가 한 늙은이가 나귀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 것을 물속에 빠뜨려 죽이고, 나귀는 놓아 보냈다. 모양이 같지 않음을 두려워하여 감히 내어놓지 못하고, 자주 매를 맞으면서도 열흘 남짓 지나서 늙은이의 시체가 썩어 알아 볼 수 없을 것을 헤아려 가져다가 원에게 아뢰어 아내를 불러 살펴보게 하니, 아내가 어루만지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것이라. ’고 하고는 남편의 옷을 가져다가 호(壕)위에서 초혼(招魂)하고, 비녀와 귀고리를 벗고, 관곽(棺槨)을 갖추어 장사하여 옥사가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원에서는 올린 장의 사안(死案)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나귀를 타고 가던 늙은이의 친족들이 늙은이를 찾아도 찾지 못하였는데, 어느 사람이 나귀의 가죽을 지고 길을 지나가는 것이 자기가 기르던 나귀와 같았으므로 잡아 고을에 호소하니, 역시 혹독한 국문으로 인하여, ‘늙은이를 겁탈해 죽이고 시체를 아무 곳에 감추었다. ’고 거짓 자복하였는데, 시체를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 금방 이곳이라 했다가 금방 저곳이라 하여, 말을 여러번 바꾸었으나 결국 시체는 찾지 못하고, 나귀 가죽을 지고 가던 자는 옥중(獄中)에서 말라 죽어 버렸다. 한 해가 지난 뒤에 전에 아뢴 장의 사안이 내렸는데, 여러 공인(工人)들이 그 억울함을 분하게 여겼으나 능히 밝히지 못하여, 장은 마침내 참형(斬刑)을 당했고, 여러 공인들은 더욱 슬퍼하고 한탄하여, 그 일을 두루 찾아 보았으나 소득이 없었다.
이에 교초(交鈔)1668) 1백 정(定)을 모아 각처 가로(街路)에 놓고, 아무 목공의 죽은 사실을 아는 이가 있으면 이것으로 보수를 주겠다고 하였다. 하루는 어떤 도둑이 다른 집에 도둑질하려 하였으나 아직 일러서 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목공의 아내 집 담장에 기대고 기다렸는데, 종 칠 때가 임박하여 갑자기 술이 취한 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와서 주정을 부리며 아내에게 성을 내어 꾸짖고 주먹질하며 또 발로 차고 하는데도, 아내가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하였다.
술 취한 자가 잠이 들자 아내는 촛불 밑에서 나직이 원망하기를, ‘자기 때문에 내 남편을 죽여서 시체를 토탑(土榻) 밑에 숨겨 둔 지가 2년이 넘도록 토탑에 불을 땔 수 없고 또 고쳐 바를 수도 없으며, 내 남편이 아직 다 썩었는지 어떤지도 모를 이 지경에 벌써 나를 학대하는구나. ’ 하고 탄식하며 울었다. 도둑은 벽창 밖에 서서 그 사실을 다 알고는 아무도 몰래 혼자서 기뻐했다. 날이 밝자 국중(局中)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에게 외치기를, ‘아무 목공이 죽게 된 진상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빨리 돈을 달라. ’고 하고, 도둑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하고, 〈목공의〉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토탑석판전(土榻席板甎)을 치우니 시체가 나타났다.
여러 공인들이 뛰어 들어가서 아내를 잡아 관에 보내니, 아내가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술이 취하였던 자는 간통한 자였다. 관에서 다시 호(壕) 속에 죽은 사람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추궁하니, 오작이 어떤 나귀 타고 가는 늙은이를 물에 빠뜨렸다고 자복하므로, 오작은 목을 베고, 아내와 그 사통한 자는 저자에서 육시를 하여 죽이고, 먼저 장(長)을 죽이라고 주장한 아전은 모두 종신토록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관(官)에서는 물에 빠져 죽은 늙은이는 바로 말라서 죽은 사람의 일임을 알았으나, 들추게 되면 관리가 또 몇 사람 득죄(得罪)할 것이므로 드디어 그만두었으니, 나귀 가죽을 지고 가던 사람의 억울함은 마침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목공을 죽인 죄는 반드시 그 아내와 사통한 자만으로 그쳤어야 할 것이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4, 5명이나 죽게 되었으니, 이는 사변이 얽히고 설켜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사기(史記)》를 읽다가 여기에 이르니 진실로 측연(惻然)하도다.
또 우리 나라 근래의 일로 말하면, 임인년에 본궁(本宮)의 종[婢] 원장(元莊)과 그 아들 개오미(介吾彌)가 고하기를, ‘선군(船軍) 임성부(林成富)가 우리 집에 와서 부도(不道)한 말을 발하였다. ’고 하므로, 의천(宜川) 군수가 곧 성부를 잡아 국문하여 매질로 고문하기를 세 차례를 한 뒤에야 자복하였으나, 사헌부의 복심(覆審)에서는 매질로 고문을 두 차례나 하여도 오히려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였고, 또 개오미가 복룡(卜龍)을 보고 성부의 말한 바를 전한 말은, 의천 수령에게 고한 것과 서로 같았으나, 복산(卜山)에게 전한 말에서는 성부가 이런 말이 있었다고 일찍이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어긋나는 단서(端緖)인데, 추핵해 밝혀서 말이 일치로 돌아가게 아니하였다.
잘 생각해 보면, 성부가 실지로 이 말이 있었다면 즐겨 자복하지 않았을 것인데, 드디어 다시 자세히 고찰하지 아니하고 성부를 그릇 사죄(死罪)에 넣은 것이다. 내가 의정부와 육조 대신에게 회의를 하도록 하였더니, 역시 죽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 옥사를 의금부에 옮겨 성부의 발언한 이유를 묻게 하였더니, 원장이 자복하기를, ‘성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함하여, 죄로 매 맞는 것을 보려고 한 것이고, 성부가 이런 말을 한 일은 없었다. ’고 하므로, 이에 성부는 죄를 면하고 원장 등이 도리어 죄를 받았다. 진실로 복안(復案)1669) 하지 아니하여 그 실정을 찾지 못하였다면, 성부가 죽게 될 것은 의심이 없다.
기유년 어두운 밤에 왜통사(倭通事) 이춘발(李春發)을 도둑이 길 위에서 쳐죽이고 그 막대기 나무는 버리고 갔는데, 춘발의 사위가 고하기를, ‘여자 무당 주련(住連)과 그 아들 사자(獅子)가 본시 장인을 원망하였는데, 지금 장인이 사자의 문 앞에서 죽었고, 구노(驅奴)가 사자의 대문을 두드리며 부르짖었어도 나와 보기를 즐겨 아니하니, 정적(情迹)이 의심스러울 만하였다. ’고 하므로, 의금부에서 잡아 국문하니, 사자의 동생 상이(象伊)가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가형(家兄)이 이웃 사람 김소고미(金小古彌)·김매읍동(金每邑同) 등과 더불어 춘발에게 대한 분한이 쌓여서 항상 쳐 죽이고자 하였는데, 지금 힘을 합하여 하수한 것입니다. ’하였고, 옥관(獄官)이 또 그 막대기를 거두어 사자의 집에 이른즉, 사자의 집 울타리의 긴 나무가 마침 하나가 빠졌는데, 그 막대기를 빠져나간 구멍에 박으니 서로 맞고 그 길이도 같으므로, 옥관이 주련·사자·소고미·매읍동 등을 심하게 고문하고 압슬형(壓膝刑)을 가하였으나 오히려 불복했었다.
그러나, 상이의 공술(供述)한 바가 의심할 만한 것이 없고, 또 막대기가 증거될 만한 것이므로 옥사가 장차 결정되려 하였는데, 내가 중한 상금(賞金)으로 춘발을 죽인 자를 고발하기를 구하였더니, 마침 변상(邊相)이 고하기를, ‘홍성부(洪成富)·김생언 등이 춘발과 더불어 예전에 혐의가 있었으니 춘발을 죽인 자는 이들이 의심스럽다. ’고 하므로, 이에 두 사람을 국문하니, 두 사람이 과연 자복하는지라, 생언에게 공모한 자를 국문하니, 생언이 진범(眞犯)은 숨기고 망령되게 왜노(倭奴)보수(普守)와 비부(婢夫) 간충(干沖)을 끌어 넣어서, 두 사람이 고문하는 매를 참지 못하여 모두 거짓 자복하기를, ‘생언을 좇아 하수(下守)하여 죽였다. ’고 하였다. 간충의 공술(供述)에는 기회를 엿본 장소와 하수인 형세라든지, 춘발이 머리와 발을 맞아 땅에 엎드러지는 형상이 더욱 자세하였으며, 옥관(獄官)이 죽인 곳에 끌고 가서 참험(參驗)하니 참으로 그렇다고 하였는데, 하수한 정범(正犯) 이득을 잡아 구문(究問)하자, 보수는 원래 모의에 참예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어 이에 사자 등과 더불어 모두 죄를 면하였다.
간충은 원래 그 뜻을 알지 못하였는데 다만 생언의 말을 듣고 춘발을 길에 불러 내었고, 마침내 죽이는 데에는 참예하지 아니하여 역시 사형(死刑)을 감하고, 성부 등 세 사람만 사형에 처하기를 논하였다. 전에 변상(邊相)의 고함이 아니었다면 사자 등은 마땅히 극형(極刑)을 받았을 것이니,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였으랴.
또 영흥부(永興府) 관고(官庫)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어떤 사람이 익명서(匿名書)로, 관노(官奴) 연만(延萬)·가질동(加叱同)·내은달(內隱達) 등의 소위라고 고하므로, 부사가 믿고 체포하여 고문하였으나 그 실정을 얻지 못하여 석방하였다. 얼마 아니 되어 군기고(軍器庫)의 실화(失火)에 대하여 감사로 하여금 방화자(放火者)를 추핵하게 하였으나, 마침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였는데, 연만과 내은달이 도망가매, 부사가 드디어 군기고에 방화한 자는 이들 관노라고 생각하고 가질동을 잡아 혹형(酷刑)으로 국문하니,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거짓 자복하기를, ‘연만·내은달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방화하였다. ’고 하므로, 이에 부리(府吏)로 하여금 다시 국문하게 하니, 부리의 신문하는 매질은 더욱 혹독하였다. 감사가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어 핵실(覈實)하고 역시 강제로 공초를 받았는데, 연만 등 두 사람이 스스로 돌아와 옥에 나아가서 변명을 구하고자 하므로, 부사가 국문하고 부리에게 내려서 또 국문하며, 차사원이 또 국문하였으나, 모두 지나친 형벌로 취사(取辭)1670) 하여 가질동의 말을 사실로 만들려고 하여, 내은달은 장 수백 대를 맞고 죽었다. 감사가 다른 차사원으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자, 연만·가질동 등이 스스로 억울함을 펴 주기를 바라서 실지로 방화한 사실이 없음을 간절히 고하니, 도리어 평반(平反)1671) 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매질로 고문을 더욱 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압슬형을 세 차례나 하여 얽어서 옥사(獄辭)를 이루고, 감사·형조·의정부에 차례로 심복(審覆)하여도 상언(上讞)1672) 하지 아니하여 대벽(大辟)1673) 에 이르렀는데, 내가 사건이 발생하게 된 형적이 없고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워서, 처결하기에 의심스러워 이에 형관(刑官)으로 하여금 가서 추핵하게 하고 그 옥사를 의금부에 옮겨서 자세히 연구하게 하였더니, 과연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에 형조 이하의 관리들을 논죄(論罪)하고 가질동·연만 등을 석방시켰는데, 옥안(獄案)을 열람해 보니, 가질동이 매를 맞은 것은 1천 3백여 대였고, 연만은 거의 4백 대나 맞았으니, ‘매질하는 밑에서는 무엇을 요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 없었다. ’고 한 것은 이를 두고 이른 말이었다. 올 여름에 이르러 수구문(水口門) 밖 초막에 머무는 중이 명화적에게 죽은 바 있었는데, 그 죽음을 벗어난 중 해전(海田)이 동내(洞內)의 돌 깨는 자의 소행으로 알려서 의금부에서 곧 잡아 국문하니, 김경(金俓)의 비부(婢夫) 막산(莫山)이 공술(供述)하기를, ‘4월 초9일 밤에, 서중(徐重)·박연(朴延)·두지(豆之)·부존(夫存)·미마이(彌麿伊) 등 5인과 더불어 수구문 밖 벌아현 초막 북쪽에 나가서 엿보다가, 밤 2경을 알리는 북 소리가 끝나자 부존이 부싯돌[石火]을 쳐서 쑥에 불을 붙여 초막에 이르니, 한 중이 밖에 나와 오줌 누는 것을 보고, 박연이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치니, 땅에 엎드려져서 죽은 것 같았다.
부존이 쑥에 붙인 불을 가지고 법당(法堂) 안에 던지자, 문득 중이 있어 그 불을 밖으로 던지므로, 부존이 또 초막의 이엉[蓋茨]을 뽑아 불을 붙여서 법당 안에 놓고, 돌을 어지럽게 던지면서 중들에게 공갈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있는 재물을 모두 다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남김 없이 죽이겠다. ’고 하니, 중들이 이에 슬피 부르짖으며 살려 주기를 애걸하고 재물을 모두 내어 주었는데, 갑자기 두 중이 도망해 나가므로, 우리들이 쫓아가서 한 중을 건천(乾川)에서 잡아, 박연이 막대기로 치니 중이 또한 엎어지는지라, 박연이 무리들과 더불어 자갈로 그의 머리와 얼굴을 쳤고, 또 한 중은 시식대(施食臺) 밑에서 잡아 힘을 합하여 묶어서 마구 매질하고는, 물러나와 밭 사이에 들어가 흩어져 누웠다가 성문 열기를 기다려서 함께 성안으로 들어왔다. ’고 하였고, 막산(莫山)이 또 공술하기를, ‘겁탈한 장물(贓物)은 주인집 다듬잇돌[砧石] 곁에 묻었는데, 아내 소근(小斤)과 미마이의 아내 장미(薔薇)가 보고 안다. ’고 하므로, 장미를 매질해 신문한즉, 공술하기를, ‘초10일에 미마이가 장물을 가지고 보에 싸서 풀무[爐冶]의 답판(踏板) 밑 빈 속에 감추었는데, 비(婢)1674) 가, ‘이것이 무슨 물건이냐. ’고 묻자, 미마이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고 이르면서, 또한 잠자코 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날 저녁을 먹은 뒤에 미마이가 문득 훔친 물건을 가지고 갔다. ’하였고, 장미가 또 공술하기를, ‘앞서 초10일 미마이가 장물을 가지고 갔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11일 옥관(獄官)이 주인 집에 이르러 수검(搜檢)하고 간 뒤에 비(婢)가 의혹(疑惑)이 생기어 문득 미마이가 감추어 둔 장물을 부엌에서 모두 태워 버렸다. ’고 하였다.
옥관이 초막 근처에서 독을 깨는 사람을 12명을 모두 잡아서 뜰 밑에 벌려 세우고 해전(海田)으로 하여금 도둑을 지적하게 하니, 해전이 김경의 집 종 부존·박연·서중·두지 등 네 사람을 지목하면서 말하기를, ‘이들이 내가 본 도둑이다. ’고 하였으며, 이튿날 또 딴 사람 20명을 벌여 세우고 부존 등으로 하여금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하고 그 사이에 섞이어 서 있게 하였더니, 해전이 또 그 네 사람을 지적하고, 또한 박연을 지목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겁박하고 때리기를 더욱 심하게 한 자이다. ’고 하니, 이에 박연이 얼굴빛이 변하여 부끄럽고 두려워하기를 남달리 하였고, 해전이 또 고하기를, ‘도둑이 나를 겁박할 때에 내가 우연히 돌 덩어리가 있어 도둑을 때렸으니, 발에 반드시 상처가 있을 것이며, 또 도둑들이 간 뒤에 가죽 끈으로 마든 승혜(繩鞋)를 버리고 간 것을 주웠다. ’고 하므로, 옥관이 관련된 사람들을 두루 불러 본즉, 부존의 발 위에 마침 상처가 있었고, 또 승혜의 임자를 물으매, 모두 이것은 부존이 항상 신던 것이라고 하니, 옥관이 더욱 의심할 바가 없어 옥사가 거의 완결되었는데, 4월 19일에 정범인 박만·망오지 등이 영서역에서 체포되어 의금부에서 국문하니, 갖추 사실을 쏟아 놓아서 흉도(兇徒)가 매우 많고, 또 바른 장물이 나온 뒤에야 막산 등의 초사가 모두 망령된 것임을 알고, 드디어 막산 등을 석방하였다.
막산 등의 망령된 초사는 실정이 아니고 매질을 면하기를 바란 것 뿐이었는데, 만일 박만 등을 잡지 못하였다면, 막산 등은 마땅히 중한 형벌을 당하였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옥사를 판단하는 데에 그 실정을 얻기는 실로 어려우니, 지난 일을 미루어 생각할 적에 혹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어찌 알겠는가, 매양 한번 생각할 적에 더욱 한심한 마음이 간절하였다.
내가 내외의 옥사를 판결하는 관리들을 보건대, 최초에 추국하여 문안(文案)이 겨우 이룩되면, 뒤에 복안(覆案)하는 자의 거개가 거기에 따라서 글로 그 사연을 만들고, 참고해 증험하고 자세히 연구하여 그 실정을 찾는 이가 있지 아니하였다. 또 상이·막산 등과 같은 옥사는 가까운 도성(都城)안에 있는 법사와 대간에서 위관·대언 등과 같이 의금부에 모여 신문하여도 오히려 혹 이와 같거늘, 하물며 다른 곳에서랴. 슬프도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로 수족이 끊어진 자는 다시 이을 수 없으니, 진실로 한번 실수하면 후회한들 미칠 수 있으랴.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불쌍히 여기어 잠시라도 마음 속에 잊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법을 맡은 내외 관리들은, 옛 일을 거울로 삼아 지금 일을 경계하여 정밀하고 명백하며 마음을 공평하게 하여, 자기의 의견에 구애됨이 없고, 선입(先入)된 말에 위주함이 없으며, 부화뇌동(附和雷同)으로 따르는 것을 본받지 말고, 구차하게 인순(因循)하지 말며, 죄수가 쉽게 자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옥사(獄辭)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요하지 말며, 여러 방면으로 힐문하고 되풀이해 찾아서, 죽는 자로 하여금 구천(九泉)에서 원한을 품지 않게 하고, 산 자로 하여금 마음 속에 한탄을 품음이 없게 하며, 모든 사람의 심정이 서로 기뻐하여 영어(囹圄)에 죄수가 없게 하고, 화한 기운이 널리 펴져서 비오고 볕나는 것이 시기에 순조롭게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너희 형조에서는 이 지극한 회포를 몸받아서 내외에 효유하라. ”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27장 B면
【영인본】 3책 320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註 1667]옥사(獄詞) : 옥사의 사연. ☞
[註 1668]교초(交鈔) : 지폐. ☞
[註 1669]복안(復案) : 결정한 안건을 다시 처리하게 함. ☞
[註 1670]취사(取辭) : 취초(取招). ☞
[註 1671]평반(平反) : 다시 조사하여 바르게 함. ☞
[註 1672]상언(上讞) : 옥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올림. ☞
[註 1673]대벽(大辟) : 사형. ☞
[註 1674]비(婢) : 장미 자기를 가리키는 말. ☞